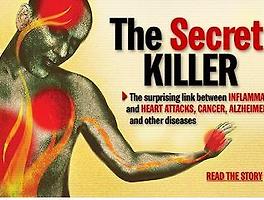수년 전에 작성한 글입니다.
부정관사는 ‘여백의 미’를 제공한다. <TIME>, <NEWSWEEK>와 같은 영자지를 읽다 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다룬 기사 제목에 ‘정관사’ 보다(또는 정관사 만큼이나) ‘부정관사’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관점에서 정관사가 사용되어야 함에도 부정관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래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선종했을 때, <타임>에 실린 ‘요한 바오르 2세’의 선종을 다룬 특집기사 제목이다.
A Pilgrim's Journey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전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임종했다면, 사실상 일반인들(적어도 <타임>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TIME>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한 교황의 죽음, 그리고 그에 관한 기사내용은 바로 ‘요한 바오르 2세의 이야기이다. 확정적이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The Pilgrim's Journey 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그런데 왜 굳이 a를 붙여서 a pilgrim's journey 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관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관사가 문법 밖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정관사, 정관사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사실 이 부분(적어도 위 헤드라인을 정할 때)은 원어민들(native speakers)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각양각색이다. 당연하다. 관사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제외하고서는 공식화된 사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짧은 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도대체 a와 the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관사를 자주 접하다보면 the 보다는 부정관사 a(an)가 붙은 제목이 더 짙은 여운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림으로 치면 ‘여백의 미’를 제공해 주는 동양화 같다고나 할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캔버스 위에 인물과 자연이 빼곡히 들어찬 서양화 보다는, 왼쪽 하단 모서리에 여백을 남겨두는 동양화의 경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여운, 즉 생각의 여지를 남겨둔다. a가 주는 느낌은 바로 이와 유사하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다. 관사에 대해 어떤 책 속에서도 a와 the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한 것을 보지 못했기에, 스스로 많은 영문을 접하면서 터득한 것이다.
위 지문을 우리말로 옮겨서 헤드라인을 만들어 보자. 아마 정관사 the를 사용한 A Pilgrim's Journey 은 1)번 정도의 예문으로 옮겨질 것이다. the Pilgrim's Journey라고 한다면 2)번 정도가 될 것이다.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무엇이다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the pilgrim 속에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잇지 않다. 하지만 the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범위를 좁혀주는 the 때문에 the pilgrim은 바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되는 것이다.
1) 한 순례자의 여정
2)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여정
아울러 굳이 부정관사 a를 붙이지 않아도 됨에도 부정관사를 붙여서 제목을 정했다는 것은 글쓴이(편집자)의 의도가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의도는 모른다. 글쓴이만 알 뿐이다.
이제 2004년 아라파트 의장(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이 죽었을 때, 그의 생애를 다룬 <타임>의 특집기사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자. 우선 아라파트를 일컬어 The Eternal Agitator 로 표현했다. 그리고 아라파트의 삶을 간략히 다룬 기사 속 박스 기사 제목에 AN ICON'S JOURNEY 라는 제목을 붙였다. 역시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투나잇 쇼>로 명성을 날린 ‘자니 카슨’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대신했다.
The Great Telecommnicator
각각의 제목이 만들어 내는 의미, 느낌은 글쓴이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면서 개념을 잡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느낌이 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음미하면서 감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느낌이 없다면? 계속 노력한다. ‘관사(article)’를 공부하는 것은 기계적인 문법학습(외우기)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오히려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설령 관사가 기본적인 문법의 틀에 아주 근접해 있다고 해도, 관사는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관사에 대해 ‘문법의 틀’을 기계적으로 들이 대는 순간, 관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접근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원어민도 관사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설령 이해는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관사는 he 다음에 반드시 am이 아닌 is 동사가 오는 문법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예문을 더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자. 사실 <타임>에서 사용하는 제목, 헤드라인은 ‘관사’를 익히기에 무척 유용한 자료가 된다.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관사 하나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28일자 타임지에서는 중국의 개혁가 ‘호요방’ 관련 기사를 짧게 다루었다. 타임은 기사 제목을 아래와 같이 붙였다.
REMEMBERING A REFORMER ((한/어느) 개혁가를 기리며)
사실 중국의 ‘호요방’에 관한 기사이기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혁가(reformer)은 특정한 인물이다. 확정적이다. 따라서 Remembering The Reformer 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결국 the 대신 a를 사용해서 보다 여운을 남기는 제목을 선택했다. 도대체 무슨 여운이 남느냐며 반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바로 잡아 줄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자.
'영어이야기 > 열린 영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전! 슈퍼모델>을 보면서 동사구를익히자! (0) | 2018.01.12 |
|---|---|
| <타임>지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정관사(the)의 기능, 본질 (1) | 2018.01.12 |
| <추격자>, <쇼생크 탈출>을 보면서 관사를 학습하자! (0) | 2018.01.12 |
| 간결의 영어학: how come, what if (1) | 2018.01.12 |
| 가주어 & 진주어: 길어지면 일단 ‘it’을 사용하자. (0) | 2018.01.12 |